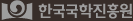안동도호부_강가형
관련시설
석불_이천동석불
- 석불_이천동석불
-
보물 115호. 이천동 소재. 제비원이라는 역원이 있던 곳에 세워진 미륵불상
- 일반정보
-
경주에서 개경을 향하고 있는 미륵부처님
안동 시내에서 영주 방면으로 가는 멀지 않는 길 옆에 커다란 석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석불이 바로 보물로 지정된 이천동석불상으로 조선시대에 제비원이라는 역원이 있던 자리여서 안동에서는 흔히 제비원미륵불이라 부른다. 미륵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이 입적한 뒤 57억 년 뒤에 오는 미래불을 뜻한다. 제비원미륵불은 10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 안동의 불교문화가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간 때이므로 여러모로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 석불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등지고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향해서 서 있는 점도 이를 잘 보여준다.
바위에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한 미륵석불
제비원미륵불은 불상과 주변 공간이 <<미륵경>>에 나타난 미륵설화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평지와 산이 만나는 곳의 큰 바위를 그대로 불상의 몸체로 하고 머리부분을 조각해서 올려놓는 방식을 취한다. 형태상의 특징은 몸을 바위에 가는 선으로 새긴데 비해 머리는 다른 돌로 조각해 올려놓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몸체의 선은 비바람에 씻겨 희미한 반면, 얼굴의 이목구비는 뚜렷하다. 자연 속의 큰 바위에 최소한의 인공미만 더하여 바위 자체가 이미 완성된 불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려불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결국 이는 현실 자연 속에 이상 인격인 부처가 나타남을 잘 드러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전문정보
-
자연거석(自然巨石)에 새겨진 미륵불(彌勒佛), 제비원석불(燕悲院彌勒佛)
안동 시내에서 영주 방면으로 가는 멀지 않는 길 옆에 커다란 석불(石佛)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석불이 바로 보물 115호인 이천동석불상(泥川洞石佛像)으로 조선시대에 제비원이라는 역원(驛院)이 있던 자리여서 안동에서는 흔히 제비원미륵불(燕悲院彌勒佛)로 통한다.
이 석불이 아미타불(阿彌陀佛)이냐 미륵불(彌勒佛)인가에 대해서는 일부 논쟁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면 미륵불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륵(彌勒)은 범어(梵語) ‘Maitreya’의 음(音)을 따라 풀이한 말로, 한문으로는 자씨(慈氏)라고 부른다. 현재불인 석가모니(釋迦牟尼)가 입적한 뒤 57억 년 뒤에 오는 미래불(未來佛)을 뜻한다.
제비원미륵불은 10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 안동의 불교문화가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간 때이므로 여러모로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 석불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일직선으로 연결해 보면 그 연결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그렇고, 경주를 뒤로하고 개성을 바라보고 있는 불상의 시선도 신라불교로부터 고려불교로 넘어가는 과도적 불상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제비원석불은 단순히 신앙상의 변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안동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제비원미륵불의 특징은 먼저 불상과 주변 공간이 <<미륵경(彌勒經)>>에 나타난 미륵설화가 가장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한 점이다. 미륵설화는 현재불인 석가모니의 제자 마하가섭(摩訶迦葉)이 미래불인 미륵불이 올 때까지 지하에서 부처 없는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다가 미륵불이 계족산(溪足山)으로 오자 지하에서부터 바위를 가르고 나타나 석가의 가사(袈裟)를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미륵불은 마하가섭의 역할을 찬양하고 그를 위하여 산 위에 탑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야외에 세워진 제비원미륵불상은 하늘과 땅의 화합이라는 설화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평지와 산이 만나는 곳의 자연거석(自然巨石)을 그대로 불상의 몸체로 하고 머리부분을 조각해서 올려놓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마주 서 있는 바위는 원래 거대한 하나의 바위가 갈라져 공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밑에서 솟아오른 마하가섭을 보여주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뒤쪽 산기슭에 있는 탑은 마하가섭을 기리는 탑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비원 미륵불상은 미륵경전에 충실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비원석불상의 형태상의 특징은 몸을 바위에 선각(線刻)으로 새긴데 비해 머리는 다른 돌로 조각해 올려놓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몸체의 선은 비바람에 씻겨 희미한 반면, 얼굴의 이목구비는 뚜렷하다. 형태적인 특징에서도 신라불상의 특징을 간직하면서도 고려불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머리부분은 균형이 잘 잡힌 신라불상의 세련미를 그대로 나타낸다. 다만 얼굴의 세밀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각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을 각이 지게 처리하여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자연거석에 선각으로 새겨진 균형 잡힌 몸체 부분도 신라불교의 표현기법을 따른다. 몸체에는 두 어깨를 감싼 통견의(通肩衣) 자락이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것과 오른쪽 어깨에서 뻗어 내린 옷 주름과 교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대고 있으며, 발쪽 대좌 부분에 연꽃무늬를 큼직하게 음각으로 새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거석에 최소한의 인공미만 더하여 바위 자체가 이미 완성된 불상이라는 생각은 고려불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결국 이는 현실 자연 속에 이상 인격인 부처가 나타남을 잘 드러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스토리가이드
-
주제 : 사랑
인물 : 연이 낭자, 김씨 총각, 염라대왕
배경 : 제비원
줄거리
제비원의 심부름 소녀 연이는 착하고 불심 깊은데다 인물도 곱다. 부자지만 인색한 이웃 김씨 총각이 비명횡사해 저승에 갔다가 연이의 선행창고 재물을 빌려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 연이에게 자신의 큰 재물을 나눠준다. 연이는 그 재물을 부처님을 위해 쓰기로 하고 5년에 걸쳐 큰 법당을 짓는데, 마지막 날 기와공이 헛디뎌 떨어져 몸이 기왓장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 그 혼이 제비가 되어 날아간다. 그때부터 이 절을 제비사 또는 연미사라고 부르고 이 일대를 제비원 또는 연미원이라 부르게 된다.
이야기 자료
<자료1>
<<안동의 전설>>, 안동시교육청
임진왜란 당시에 원군으로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난이 평정되자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훌륭한 인물이 날 자리를 골라 혈(穴)을 끊었다고 한다.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던 이여송이 말을 타고 제비원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말이 우뚝 서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긴 이여송이 사방을 둘러보니 큰 미륵불이 우뚝 서 있었다. 틀림없이 저 미륵불 때문에 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여송은 차고 있던 칼로 미륵불의 목을 쳐서 떨어뜨려 버렸다. 그제야 말발굽이 떨어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
칼로 벤 까닭에 미륵불의 목 부분에는 아직까지 가슴으로 흘러내린 핏자국이 있고, 왼쪽어깨에는 말발굽의 자국이 있다.
당시에 떨어진 목은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어느 스님 한 분이 와서 떨어진 목을 제자리에 갖다 붙이고 횟가루로 붙인 부분을 바르면서 염주 모양으로 볼록볼록 나오게 다듬어 놓았다. 지금도 보면 이은 자리는 마치 염주를 목에 걸어 둔 것 같다.
<자료2>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해 북진 중 제비원 앞을 막 지나가는데 말들이 제자리에서 꼼짝을 않았다. 자세히 보니 말의 다리들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여봐라, 이건 필히 조선놈들이 마술을 부리는 것이다. 흩어져서 알아보도록 하라.”
그의 부하들은 명령이 내려지자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리고는 어느 한 암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왜군의 대장은 즉시 그리로 가서 법당의 스님을 끌어 내렸다.
“이 놈 듣거라. 어찌하여 우리 말들이 꼼짝도 할 수 없지? 누가 마술을 부리는가?”
벌컥 소리를 질렀으나 스님은 지긋이 웃기만 했다. 그러자 왜군 대장은 흥분하여 더 큰 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저는 불도에 정진하는 사람일뿐 마술 같은 것은 알 수 없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살생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부처님이 그랬을 것이요.”
“뭣이 부처님이라고. 여봐라 샅샅이 뒤져 모두들 찾아라.”
그러고 난 잠시 후 뜰에 돌부처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그곳으로 다가갔다.
“잘 보아라. 이 칼의 위력을”
-(중략)-
몇 번 숨을 가다듬은 왜장은 칼을 높이 들었다. 스님은 계속 나무아미타불만 외어 댔다. ‘쉭’ 소리와 함께 칼이 허공을 갈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돌부처의 머리가 툭 떨어지는가 싶더니 몸의 목 부분에서 붉은 피가 펑펑 솟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번개가 내려쳤다.
“저 스님을 놓아주어라.”
우왕좌왕 벌벌 떠는 부하들에게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왜장은 외쳤다. 그러나 이내 번개가 대장에게 떨어지더니 그를 죽여버렸다. 이 때 의병들이 나타나더니 왜군을 물리쳐 쫓아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목이 없는 돌부처엔 희미하나마 피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